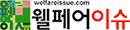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국장님, 상담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전해진 카톡이었습니다. 최근에 몇 번, 아주 드물게 사무실 인근 동네에서 마주친 엄마였습니다.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2014년 그 무겁고 경황이 없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엄마입니다.
길고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묻기는 했지만,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말그릇 가득히 담긴 고민들을 털어놓을 누군가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질문과 이야기는 대부분 답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건 000의 엄마로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예요.”
수많은 주변 환경 여건들을 내려놓고, 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2014년이었다면 제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관계의 단단함을 믿어,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이름 앞에서는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해왔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아이를 위해서는 뭐라도 하고 싶지요.”
떠난 아이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아이처럼, 엄마는 굳건한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결정을 하기 보다, 엄마를 위한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서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깊이 오랫동안 끌어안아 위로했습니다. 문득, 그녀의 모습과 겹쳐지는 다른 유가족이 생각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슷한 참사가 나고 말았어요.”
흙빛이 된 얼굴로 고개 숙여 사과를 했던 건 정부나 해양경찰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공주사대부고 아이들이 교과과정의 하나로 해병대캠프 훈련에 참여를 했고, 안타깝게도 다섯 명의 아이들이 세상을 달리해야 했습니다. 관계부처에 오랜 시간 책임을 물어왔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억하는 추모관을 포함한 도서관을 학교 내에 건립했고, 아이들을 기억하는 날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깊은 슬픔에 함께 하고자 찾아간 세월호 피해 부모들에게 공주사대부고 피해 부모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활동을 열심히 했더라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참사가 있던 날도 공주사대부고 부모님들은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참사 소식을 듣자마자 팽목으로 달려갔었노라고 전했습니다.
참사현장에 있다보면, 먼저 발생했던 참사의 가족들이 찾아와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손을 건네는 장면을 종종 마주합니다.
감정적인 동의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기도 하고, 언제든 함께 할 것에 대한 연대이기도 합니다. 그 말들 속에 항상 깊은 사과가 함께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바꾸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사과입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보다 피해자인 시민들이 서로에게 사과를 합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위로를 전하러간 시민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정말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썩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음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피해 가족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개인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가족들이 잊지 않는 기준은 떠나보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과 내가 겪은 이 큰 슬픔을 누군가가 또 겪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가족들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를 따져 물으며 하는 활동들은 떠난 아이를 위한 유가족으로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겨진 우리를 위한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유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가족”이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폄훼와 힐난으로 그들의 삶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더욱이 그 단어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천민자본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참사 직후 일주일도 안 된 때에 보상금부터 보도한 언론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는 가족들을 사찰하는 정부 기관, 구조하지 않으면서 구조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해경 관계자와 구조보다 의전이 먼저였던 정부 관계자, 생명과 안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 피해자들에게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는 더욱 어렵고 힘든 삶이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숨지 않고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참사 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자고 요구하며 노력하는 삶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희생자’ 혹은 ‘유가족’이 될지 모르는 남겨진 우리를 위한 선택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난 유가족의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 사과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렇게 당신의 안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