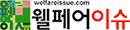정부는 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그리고 돌봄 교실 등을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한 후, 2022년까지는 17개 전체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세우고, 6만3천명까지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복지분야의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사회서비스공단’이었다. 다른 ‘공단’들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가 100%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지는 형태였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담과 직접운영에 따른 리스크 때문인지 슬그머니 발을 빼면서 명칭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했다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복지시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추진배경으로 들고 나온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고용의 안정성 제고’는 현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고용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이 불러온 잠꼬대 같은 논리다.
지금 모든 사회서비스는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일탈적인 부문과 시설이 있지만, 그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거나 개인적인 범법행위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성의 기준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말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지금의 법 테두리만으로도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수는 없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법인’이다. 뭘 더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회서비스원’이 지금까지의 논의대로 강행된다면 옥상옥이 되거나 정치공학적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퇴직공무원이나 선거공신들을 위한 일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우의 수(number of cases)’를 고려한 현장친화적인 논리를 새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 어떤 논의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서툰 도끼질은 엉뚱한 부작용을 양산할 뿐만이 아니라 제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