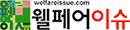휠체어를 타는 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두 돌이 지난 지금에야 유모차 조차 갈 수 없는 곳이 어찌나 많은지 알 수 있게 되었지만, 20대 중후반 때의 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때 저는 소아물리치료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따라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과 함께 연 날리러 가보고, 별도 보러 가고, 축구장, 야구장에 가기도 했지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며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의 삶을 외면한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뭘 하나 먹으려고 해도 휠체어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았고, 겨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테이블 사이를 지나갈 수 없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거나,주인과 손님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디기도 해야했죠.
음식점 뿐이었을까요? 활동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마냥 즐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럴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이었지만 말이죠.
그때 여행을 기획했던 선생님께 왜 이렇게 아이들이랑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얘들 치료를 하다 물어보니, 밖에 나간 경험이 거의 없더라. 특히 집 밖에서 잔 적이 한번도 없는데 너무 하고 싶다고 하길래 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아내와 함께 집에서 나름 캠프를 한 적이 있어. 그렇게 그냥 다니기 시작한 거 같은데?”라고 무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무심했지만 실천은 전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이고, 중간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거죠.
여행이 여행의 꼬리를 물고, 추억이 하나씩 쌓여 가면서 저희들은 하나의 꿈을 세웁니다.

'아이들과 일본 여행 떠나기'
장소를 큐슈로 정하고 나서는 치료사들끼리 답사도 다녀왔죠.
그렇게 휠체어 탄 뇌성마비 아이들과 큐슈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큐슈를 누비며 정말 재밌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과 부모님, 치료사들과 함께 나누려고 영상을 만들었고, 종종 제가 보고 싶어 유투브에 올렸던 것을 공유합니다. (그땐 블로그나 유투브에 올리는 걸 동의했지만, 꽤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것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 링크로만 대체합니다)
https://youtu.be/I53RAKuM5q8
일본여행을 하며 많이 놀란 게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3박 4일 동안 단 한번도 휠체어로 인해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휠체어를 탄 아이들을 신기하거나 특별하게 쳐다보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한국사람이었던 기억..)
그래서 3명의 아이들이 느꼈던 자유로움을 듣는데, 아이들의 관점으로 조금이나마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마지막날 저와 짝이었던 친구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평생 치료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블로그에 남겼던 그 아이와의 하루도 함께 공유합니다.
https://blog.naver.com/february022/100152593412

그때 저는 치료적으로 주로 아이들의 '비정상적' 패턴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의 경험들에서 '정상적'인 움직임, '정상적'인 삶이 뭐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장애인처럼 걷고 움직이는게 정상적인 걸까?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한국에서 어려움 투성이었던 아이의 일상이일본에서는 자유로운 일상이 되었는데, 이건 아이에게 어떤 삶인걸까?
이런 고민들이요.
지금은 '정상적'이란 단어를 거의 쓰지 않지만 그때 저에겐 아주 중요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직업적 가치와 기준에 대한 감정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물리치료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이런데, 백날 치료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나아지겠어? 하는 대게 3년차쯤 오는 슬럼프 비슷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때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보면 아이들이 나아지는 게 치료하는 나 때문인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가 가진 발달의 힘인지, 치료가 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치료행위를 통한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와 같은 고민들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생활 환경과 내 선택에 의해 배우고 경험한 것들로 일상이 돌아가는 중에 다른 경험과 기준을 겪으며 시야를 넓히게 되니 내 고민과 가치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첫직장을 다니던 이 시기에 겪었던 경험들이 앞으로 저의 삶의 변화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조금 덜 망설이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 남들 다 하듯, 오르막 내리막 하며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