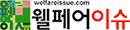책을 극성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아진 세상인지라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법과 복지정책 그리고 상담심리에 관한 책들을 자주 본다.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많아서 그런지 관련 도서들이 많아서 참 좋다. 책들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는 즐거움이 크다. 저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다.
특히 몇몇 책들은 가히 ‘인생 책’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기막히다. 지금도 책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그런 책이 몇 년째 꽂혀 있다. 복지정책과 사회법에 관한 책이다. 의문이 들거나 참고할 일이 있으면 뽑아서 보는 귀한 책들이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책이 너무 두껍다는 것이다. ‘쓸데없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을 정도다.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500페이지를 넘는 책들이 허다하다. 인내력을 시험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두툼하다.
솔직히 읽는 과정에서 벌써 언짢은 책도 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 물론 좋은 전문서적도 있다.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고 해도 다시 읽을 용의가 있을 정도로 알찬 책들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은 읽고 난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내용을 내폭 줄여서 썼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언부언이 너무 심하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법학서적들은 하나같이 두껍다. 페이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출간하는 법학도서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다. 서점에 가서 헌법에 관한 책들을 보면 다들 놀랄 것이다. 민법에 관한 책들을 보아도 그 두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쩌자고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동원해서 막무가내로 써내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재차 지적하지만, 굳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알기 쉽고 간편하게 써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페이지를 늘리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개인적으로 전문서적이건 교양서적이건 간에 400페이지 정도면 적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전문서적인 경우라도 핵심적인 내용만 담으면 400페이지 안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세분화된 주제에 대한 연구물은 별도의 책에 담으면 될 일이다. 굳이 말하자면, 몰아서 두껍게 쓰지 말고 나누어서 얇게 쓰면 훨씬 가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책을 두껍게 내는 것이 장땡인 시대는 지났다.
출간된 책은 많이 읽혀야 된다. 저자(著者)만 즐거운 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종이책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다. 적정한 두께의 쉽고 가벼운 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