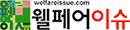오늘 글의 제목은 ‘가문비나무의 노래’라는 책에서 따온 것이다.
이 책은 마틴 슐래스케라는 바이올린 제작 장인(匠人)이 썼다.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내용들을 담담하게 풀어 쓴 책인데, 종교적 지혜가 가미되면서 더 많은 감동을 담고 있다.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의 배려가 곳곳에 배어있다. 책을 읽으면서 고마운 느낌이 들었을 정도다. 생각의 창을 열게 하는 문장도 많다. 예컨대, 계획 없는 행동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목욕물을 버릴 때 사람까지 함께 버리는 어리석음’이라고 꼬집었다. 오늘 글의 제목이 된 문장도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가져왔다.
이 책은 ‘자유 없는 성실’을 굴종이라고 썼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노예상태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강요된 성실만이 존재한다. 그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생존을 볼모로 하는 불이익이 침입한다. 정치적으로 미개한 나라나 군사문화를 차용한 집단에서 애용하는 지도원리다. 그런 곳에는 진실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강요와 위선적 굴종 그리고 폭력이 날뛸 뿐이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통치하던 시절, 자유 없는 성실이 근면으로 둔갑해서 온 국민을 옭아맨 시절이 있었다. 또 돈에 환장한 기업의 사업장에서도 자유 없는 성실의 깃발이 요란하게 펄럭인 적이 있었다.
자유 없는 성실이 굴종이라면, ‘성실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성실하지 않은 자유는 망나니의 칼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개판이다. 방탕과 싸움과 게으름이 판치는 막장이다. 원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도 그 표현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자유에는 성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야 아름답다. 일반적으로 ‘성실’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중간수준의 선량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자유도 이 성실의 한 부분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유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도 사실은 사회적 약속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 없는 성실’은 많이 사라졌다.
강요된 노동이나 일방적 굴종이 전제된 관계는 법이 제한하고 있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아동이나 여성의 비참한 노동이 강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유 없는 성실 강요는 처벌의 대상이다.
문제는 ‘성실 없는 자유’다.
자유는 한껏 누리되, 성실의 짐은 팽개친다. 권리는 강조하되 책임이나 의무는 아몰랑이다.
자유 없는 성실이 사라진 자리에 성실 없는 자유가 괴성을 내지르고 있다. 행여 이런 풍조가 우리 사회복지계에도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럽다.
자유 없는 성실도 몰아내야 하지만, 성실 없는 자유도 마땅히 몰아내야 한다. 그래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