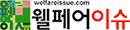사춘기에 들어선 딸이 동생의 존재를 숨기기 시작했다. 아니, 숨겼다기보단 굳이 알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어쨌든 쌍둥이 동생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에게 동생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눈여겨 볼만한 변화다.
사춘기라 그럴 수 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앞머리만 쳐다보는 줄 아는 시기다. 그만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 낯선 몸짓(상동 행동)과 외계어 같은 소리로 타인의 이목을 끄는 동생의 존재가 달가울 리 없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라며 말을 건넸더니 뜻밖의 얘기를 한다. 동생의 존재가 부끄러워서 얘길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겨워서 안 한다는 것이다.
분명 ‘발달장애’라고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무슨 장애인지, 그게 뭔지 계속해서 물어본다고 했다. 동생 얘기를 꺼내면 그 다음부턴 만날 때마다 같은 설명을 하고 또 해야 하는 게 너무 지겹다고. 그래서 먼저 알리지 않는 것뿐이라고.
아하. 그러니까 딸은 부담스러운 것이다. 친구들에게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동생은 어떤 사람인지 등을 늘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딸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도 느껴졌다.
발달장애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알고 있다면 딸은 동생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 동생은 발달장애가 있어” 그 한 마디면 된다. 그러면 친구들은 “그렇구나”하고 말 일이다. “나는 할머니와 같이 살아”라고 했을 때 할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그냥 “그렇구나”하고 끝이다.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도 그래야 한다.

(작가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딸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다. 매년 4월이면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받았다. 그 많고 많은 교육 중에 발달장애를 다룬 교육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모두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신체장애에 대한 영상을 보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이해도가 가장 낮은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신체장애인과 달리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럴수록 더 필요하다.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배우는 교육의 기회,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존의 기회,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장애 유형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
어린 딸이 비장애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발달장애’ 전도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동생은 발달장애가 있어”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그렇구나”하고 곧장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에선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더 행복할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