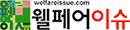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발달장애인 형제의 가족)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쉬는 시간, 반에서 유난히 키가 컸던 한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모인 자리로 나를 불러내 소리쳤다.
“얘네 형이 우리학교 다니는 나이 많은 장애인이래.” 그 순간 나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우두커니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던 나는 그 날부터 반 친구들에게 장애인 동생이라는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난다. 형은 나와 7살의 나이차이가 났지만 1990년대에 형이 갈 수 있던 중학교가 없어 내가 4학년이 되던 해 특수학교라는 것이 생길 때까지 유예를 해야만 했다.
벌써 20년도 훌쩍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그 날의 기억이 선명하다. 가족의 존재 자체로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시험받아야 했던 9살 꼬마에겐 상처로 기억되는 사건 중 하나이다.
그 사건 이후 꽤 오랜 시간동안 나를 괴롭힌 질문이 있다. “왜 형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장애라는 것은 무엇이기에 놀림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비장애형제로서 내가 마주하는 세상이 이렇게나 힘든데 형이 살아왔던 그 삶의 무게는 어땠을까?” 등 장애인인 형의 존재와 장애인 동생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이다.
애석하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심지어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이 질문을 쉬이 털어놓지 못했다. 9살의 나를 놀렸던 그 아이가 혹은 그것을 방관하며 웃었던 친구들이 내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의식 속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다수의 일원이 내가 될 수 있던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소수가 되는 경험으로 인해 조금 일찍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다수가 규정해놓은 편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의식적으로 비장애형제로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했다.
흐릿해져 갔지만 마음 한 켠에 계속 남아 있던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은 성인이 된 후 우연한 계기로 찾을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두 번째 직장에서 성인기 비장애형제자매 자조모임을 만들었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양한 비장애형제자매들과 마주하며 나의 경험을 보다 객관화할 수 있었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뻐하고 때론 함께 아파했다. 그 시간들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왔던 그리고 살아갈 삶은 비장애형제자매라는 범주를 축소한 결과가 아닌 그 범주를 확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비장애형제라는 정체성으로 남들과 다른 경험을 통해 더 풍성한 자아를 경험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장애인가족이 아니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비장애형제라는 정체성과 고군분투하며 혼란을 경험했지만 그만큼 더 확장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가족 안에서의 비장애형제자매라는 정체성을 건강하게 수용하고 내면화한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더 많은 공간에서 비장애형제자매라는 고유한 정체성과 그들의 모임이 담론화되고 공론화 되어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