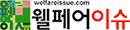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초인 이번 주까지는 어색하지 않은 인사다. 수많은 SNS에는 새해 인사와 결심이 가득하다. 개인 메신저에도 한해 인사를 건네느라 바쁘다. 새해의 희망을 담아 먼저 메시지를 보낸지가 언젠가 싶다. 열여덟해를 곱게 키워온 아이를 앞세운 부모들에게 새로운 날이 가지는 의미를 담은 인사를 건네는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올해는 그래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부모님들이 새해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그 문자를 보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는 답하기가 참 어려웠다.
“‘아이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웃어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곁에 있을테니까 그 앞에서 애써 웃는다.’고. 그런 이유로 집에 오면 고단하다는 말과 함께 이야기 하더라고요.”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1년 365일 울거나 우울에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갖힌 편견이다. 그러나 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참사에 대한 현재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동의해주며 행동하는‘내 편’인 시민들이 남기 위해서는 시민들 앞에서 웃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이란다.
2014년에 재난참사 피해가족을 만나면, 높은 경계와 분노를 시민들에게 표현했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배 안에서 스러지는 순간에 구하지 않았던 사회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절규했다. 그 외침은 본인을 포함한 모두에 대한 분노였다는 걸 안다. 지금은 그들이 언제 그랬는가 싶게 보드랍다. (물론, 지금도 종종 분노하고, 화를 감추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 그들에게 1년 속 날들은 재난 참사 피해자가 아닌 시민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신정에는 떠난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탔던 세월호 앞에서 새해를 맞이한다. 결심이다. 꼭 진실을 밝히겠다는. 구정과 추석에는 아이들 차림상을 차린다.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떠올려, 일주일 전부터 가장 좋은 재료를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 장을 보고 준비를 한다. 두 번째 해까지는 오르지 않았던 술이, 살아 있다면 이제 스물여섯살이 되었을 너에게 건넨다며 상차림에 오른다. 벚꽃이 피는 4월초 부터는 그 아래에서 사진찍던 마지막을 남겨준 아이들이 너무도 그리워서, ‘빨리 모두 져버려라’싶게 예쁜 벚꽃이 아프다. 4월 16일은 배가 거꾸러진 날이지만, 그 날부터가 304명의 기일이 시작한다. 그 다음 해 3월까지. 가장 많이 품으로 돌아온 달은 5월과 6월이니, 상반기는 무거운 집안의 공기를 형제자매와 부모들이 모두 견디기 어려워한다. 크리스마스나 연휴가 긴 날들이면, 집안을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건네며 곰살맞게 굴었던 아이들이 더 생각난다. 한때, <Sorry Christmas>라는 크리스마스 웹카드가 온라인에 오르기도 했다.
‘00엄마 오늘 안 나왔네.’‘응, 오늘 애 생일’하면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아이들의 생일날이면 주인이 자리하지 못하는 케잌을 사서, 봉안당을 찾는다. 4.16재단에 오고나서 <엄마의 노란손수건>이라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만들던 아이들 생일 달력을 만들어 오고 있다. 단 한건의 참사가 아니라 304명, 한명 한명을 앗아간 참사라는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다. 정확하게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세월호 참사를 위해 애쓰던 분들의 생일이 담겨 있다.(애석하게도 일반인들의 생일은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여느 달력과는 달리 한해 전부가 걸린다. 2015년부터 만들어 오셨던 시민 네 분과 함께 만들고, 가족들에게 그 과정과 결과물을 확인한다. 아이들의 다음 해 생일을 확인하고, 수많은 기록을 찾아, 부모들에게 확인해 생전 아이들의 취향을 담은 소개글을 작성한다. 사진 자료를 찾아 한명 한명의 얼굴을 그려 담아 달력 디자인 시안에 담아 마무리한다. 한 줄, 하나의 펜 터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 부모들에게 100% 만족스러운 결과물일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떠난 그들의 생에 견줄 수 없고, 부족하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다른 의미다. 나도 재난 참사 현장에 오고는 하루, 하루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노동 현장에서 매일 평균 여섯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민의 권리를 세우기 위한 ’서명의 연명을 요청해온다. 연일 지속되는 영하의 날씨나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피켓을 드는 시민들의 소식과 자식을 잃은 엄마의 절규가 들리기도 한다.
매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의미는 아니다. 때때로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오는 누군가의 애끓는 심정이 담긴 활동에 대해 편견을 갖기 전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살펴보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본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낫게 느껴지는 건, 그들의 피땀으로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당신의 하루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평안한 2022년이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