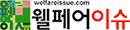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어르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택배를 하나 부칠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갔는데 담당직원이 나를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많이 듣던 호칭이 아니어서 어색했지만,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 영역에 입문해서 25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벌써 70줄에 들어선 것이다.
현직에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밀린 현안을 해결하기도 했고, 관장들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머리도 하얗게 변했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나이가 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나 힘이 달라졌다. 퇴직한 이들을 만나면 한결 같은 이야기를 내놓는다. ‘마음은 청춘이다’는 말이다.
그러나 마음만 그렇지, 몸은 청춘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매일 경험한다. 10여 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이면 꾸준히 산행을 했고, 5년 전부터는 매일 아침 걷기와 뛰기를 계속하고 있으나 모든 것이 예전 같지가 않다. 건강검진이나 정기진료시간에 담당 의사들로부터 여러 지표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칭찬을 들어도 피부의 탄력성이나 근력의 허망함은 어쩔 수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있다. 불필요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물론 퇴직하면서 곧장 시작한 일이긴 하다. 모임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책들은 버리거나 기증했다. 이제 모임은 2개로 줄였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책이나 논문들은 대부분 정리했다.
마음의 정리도 중요했다. 은퇴와 동시에 조용히 사라져야한다는 선배 목사님의 조언을 금칙으로 삼았다. 여기저기 기웃거릴 일은 아예 없애버렸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도 절반으로 줄였다. 예전에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참석했는데, 이제는 그럴 여력도 줄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가온 손짓들도 거절했다. 사회적 반경이 좁아졌지만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먼저 옹색함이 떠오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분수에 맞게 ‘즐기면서 사는 삶’을 말한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살아도 즐겁게 삶과 시간을 엮어낼 수 있다. 요일별로 해야 할 일들을 정해놓으면 무력감에 빠질 일도, 지루할 일도 없다.
또 하나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이 많으면 실언이 튀어나온다. 더구나 이런저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할 말이 있으면 글로 하면 된다.
웰페어이슈에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면 나잇값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