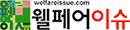지난해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딸이 호들갑을 떨며 말한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패드립(패륜과 드립의 합성어)했어”
“응? 패드립이 뭐야?”
“부모님 욕하는 거. 그게 패드립이야”
교사가 학생에게 부모님 욕을 했다는 말인가? 상황은 이렇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 반에는 음성틱이 있는 학생이 있다. 갑자기 들려오는 “끅” “끅” 소리에 딸도 처음에는 놀랐다고. 그러나 음성틱으로 인해 나는 소리는 교실 밖 자동차 소리처럼 이내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처럼 느껴졌고 곧 적응이 됐다고. 그런데 이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교과 수업 시간에 사건이 터졌다.
“야! 너 그 소리 좀 안 낼 수 없어? 그거 병이야 뭐야? 병이면 봐주겠는데 습관이면 고쳐”
단호하게 말하는 교과 선생님에게 학생은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 당사자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반 친구들은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갔던 데다 ‘교실 안에선 대화 금지’ 규칙으로 인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원천차단돼 있던 탓이다.
이렇게 같은 반이지만 친구는 아닌, 사실상 모르는 아이들 속에서 틱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자신의 틱이 병이라고 밝혀 졸지에 ‘아픈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 아니면 습관이라고 말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까? 즉, 선생님이 제시한 보기에는 처음부터 적절한 답변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 학생은 “신경쓰지 마세요”라 말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 신경 쓰지마? 네 부모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그따위로 가르치든!”이라며 선생님의 분노가 교실을 뒤덮었다고.
20~30년 전 과거의 일이 아닌 바로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현실이 이렇다.
‘장애’를 아픈 사람이 앓는 병으로 바라보거나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의지’의 문제로 접근한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지적장애인 아들이 특수학교로 전학가던 날 “동환아, 꼭 낫길 바래”라는 반 친구들의 편지를 받은 건.
땅콩 알러지는 개인의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불안할 때 다리 떠는 습관도 고쳐서 나아지는 병은 아니다. 장애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가진 자연스러운 특성 또는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누군가는 과민성대장염이 있듯 아들에겐 지적장애가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증상(현상)엔 그냥 적응하고 관리하며 살아가면 그만이다. 이런 것이 장애다.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 넘게 흘렀다. 이젠 이 정도 장애인식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너무 큰 바람인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기대를 품어본다.
내 아들의 지적장애가, 그 학생의 음성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새해니까 빌어본다.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소원 한 조각.